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으면 제조사는 망한다. 물론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유통이 관건(關鍵)이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 소비자와 연결할 통로는 확보해 두었는데 팔 물건이 없다면 유통회사는 버틸 수 있을까. 생산자는 유통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이용료를 주고는 최소한의 이익도 내지 못해 버틸 수 없다고 아우성이고, 유통업체는 그동안 유통망 구성을 위해 쏟아부은 초기 투자금이 워낙 많고 경쟁을 위한 자금도 필요해 이용료를 낮출 수 없다고 맞선다.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 양쪽 모두 치명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버틴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배달 앱 플랫폼사들과 소상공인들은 지난 7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만들었고, 세 차례 회의도 열었다. 그러나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윈-윈을 위한 협의는 사라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상생 협의의 핵심은 수수료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의 배달 수수료는 평균 10%선이며, 회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 3%가 더 붙는다. 신용카드 수수료(0.5~1.5%)에 비해 훨씬 높다.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배달비, 광고비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의 20%가 플랫폼 관련 지출로 빠져나간다고 말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식재료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은 별도다. 매출이 늘어도 적자라고 한숨짓는데,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치솟고 있다.
정부 대응은 실망스럽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수수료 이슈는 없었다.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이유다. 상생안을 만들지 못하면 권고안을 내는 방식으로 협의회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별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아니다.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것도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갈등을 방치하고 키우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방임(放任)이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내수도 회복된다. 무엇이 먼저인지 답은 벌써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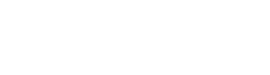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