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모태신앙에다 촉망 받는 신자였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다닌 교회엔 보건사회부 고위공무원인 권사님이 계셨다. 어머니 말로는 사창가 여성을 보호·관리·계도·재활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권사님의 단골 멘트는 '윤락여성'이란 단어였다. 윤락(淪落)이라니.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지는 행위, 즉 모든 과실과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다니. 내 기억 속의 권사님은 무서운 분이었고, 늘 단호하고 엄격했으며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강력한 신봉자였다.
1970년대는 박정희 시대였고, 군사부일체(軍師夫一體·군인정신으로 학교·직장과 가정이 총화단결해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시절이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전제정권은 국민의 성을 가장 먼저 통제하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남자의 배꼽 아랫일은 상관하지 않았다지만, 국민은 통행금지와 장발·미니스커트 단속으로 밤을 꼴딱 새는 찐한 연애 한 번 하기 쉽지 않았다. 극장의 심야상영은 명절 전날과 성탄 이브, 12월 31일에만 가능했다. 여학생과 빵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학을 맞던 세상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을 리 없다. 그러니 '나는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청계천 세운상가 빨간책에서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여전히 성(性)은 부끄럽고 겸연쩍고 쑥스러운 대상이다.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 하느라 그릇된 정보에 휩쓸리거나 무자격 시술에 고통 받는 일도 벌어진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나보다. 우리가 배꼽 아래 기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쉬운 임상사례로 알려주는 친절한 해설서. 비뇨기과 전문의 고제익의 '남성의 중심'이다. 각설하고. 책 표지부터 기막히다.
'남성의 중심'은 남몰래 주위 눈치 봐가면서 귓속말로 전하는 근엄하고 진지한 비뇨기관 이야기가 아니다. 포장마차에서 입담 좋은 동네 형이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봐. 이거 무척 중요해"하며 건네는 진심어린 조언이다. 불편하거나 불쾌하기는커녕 키득키득 대며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그럼에도 귀에 쏙 박히는 의학 에세이다.
저자는 진료 경험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비뇨기의학 지식과 활극에 가까운 드라마틱한 사례를 가감 없이 진술한다. 예컨대 '트리믹스의 비극' 같은 대목에선 잘못된 의학지식과 불법 시술이 초래한 재앙에 아연실색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의심하고 있는 포경수술에서 출발"(13쪽)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깔끔하고 지병 하나 없는 일흔 여섯 '노인의 부탁'으로 시작하는 책은 첫 꼭지부터 독자를 무장해제 시킨다. 마무리는 성기에 관한 장인데 많은 분량을 할애해 문답체로 친절하게 풀어낸 덕분에 불편함 없이 접할 수 있다. 독자를 배려한 선택이다.
"없으면 안 되는 것.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것. 비뇨기과는 그러 것들이 달려있는 장기를 돌보는 진료과목"(193쪽)이라고 말하는 비뇨기과 의사 고제익.
제목만 보고서 남자가 읽는 책이라고 속단하면 오산이다. 이 책이야 말로! 아들 키우는 엄마가, 남편과 애인을 가진 아내와 여성이 읽어야 한다고 믿는다. 딱딱한 의학 이야기를 지루함 없이 완독하게 만드는 맛깔스런 글 솜씨는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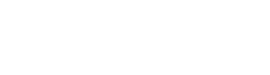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