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우선 환율 문제가 숨통을 트게 됐다.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00%p에서 1.50%p로 좁혀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부담을 덜고, 3분기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복귀도 기대된다. 금리 차가 줄어든 것은 반갑지만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자 부담을 덜게 되면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해 왔다. 물론 대내외 여건(與件)은 무르익었다. 여전히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2%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한은도 고금리가 민간 소비 회복을 늦추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고심하고 있다. 2020년 말에 비해 올해 8월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약 17%나 된다. 부동산 광풍의 기대감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물가는 치솟았고 빚이 늘어난 데다 이자까지 높다 보니 쓸 돈이 없다.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다. 연준의 빅컷을 경기침체(리세션) 우려로 분석해서다. 지난 8월처럼 글로벌 증시 충격에 이어 반도체 수요 등 실물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경제 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선제(先制) 대응하면 내수 회복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되찾겠지만 부동산과 가계 대출 리스크를 넘지 못하면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이 폭증한다는 가정도 재검토해야 한다. 금리가 아니라 대출 총액이 관건이다. '영끌' 재연까지 벌어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강력한 규제를, 쌓여 있는 미분양 탓에 옴짝달싹 못 하는 지방에는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전제로 한 융통성 있는 경제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2022년 2.6%의 절반 수준이다. 확실히 반등하기 위해 올해 성장률은 최소한 2%대를 회복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사활(死活)이 걸려 있다.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https://www.imaeil.com/photos/2025/04/25/20250425181904121745572744_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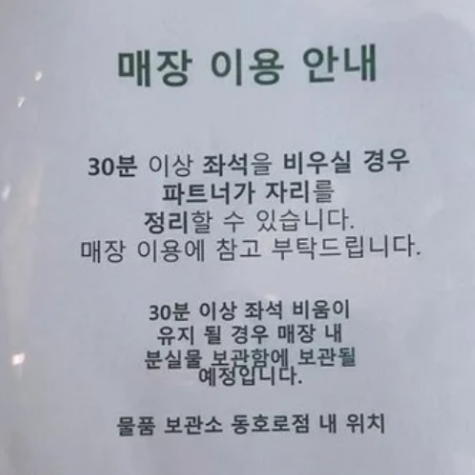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文,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에 대한 보복"
이재명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