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체들의 구인난(求人難)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심각성은 사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를 보완할 제도조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수도권 인력 유출에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조기 귀국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제조업 자체가 고사(枯死)할 판이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대학 졸업자에게 제조업체 취직을 권하면 모욕이 되는 시대"라며 분위기를 전했고, 다른 대표는 "회사를 접고 가족과 아르바이트하는 게 나을 판"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규모가 작을수록 구인난이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대구의 5인 미만 제조업체의 미충원율은 7.4%, 5~9인 미충원율은 14.7%에 이른다. 전체 산업 평균 미충원율에 비해 2~3배 높다. 영세(零細) 제조업체들은 사장 1인 기업과 다름없다. 사장이 온갖 업무를 떠맡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져 일거리는 줄어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설비 도입은 엄두도 못 낸다. 젊은이들은 땀 흘려 밑바닥부터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제조업 분야에선 젊은 시절 경력을 디딤돌 삼아 훗날 자기 사업체를 만들어 성공한다는 개발 경제 시대의 이야기들이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기는커녕 잊힌 신화(神話)가 됐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부터 손봐야 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늘지만 제약도 많다. 제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채용 노력부터 입증(立證)해야 한다. 그런데 헛수고에 불과한 채용 공고를 내는 시간을 낭비하느라 주문 납기도 맞추지 못할 처지다. 간신히 구한 외국인들도 일정 기간만 근로가 가능하다. 비자 만료 외국인을 계속 고용했다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숙련공(熟鍊工)이 됐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업체도 손해가 크다.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처우(處遇)도 개선해야 한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https://www.imaeil.com/photos/2025/04/25/20250425181904121745572744_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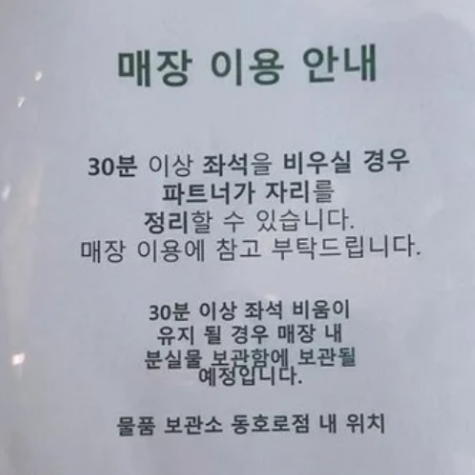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
文,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에 대한 보복"
이재명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