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렸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한국전력의 화급(火急)한 재무 위기를 일부 덜면서도 힘든 서민 경제를 고려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이다. 그러나 요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전의 재무 건전화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산업계는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한다. 지난해 11월에도 산업용 전기료만 올랐는데, 1년 만의 추가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료는 10.2% 인상됐다. 반도체·철강 등 전기 다소비(多消費) 업종의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도 울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不可避)한 측면이 많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팔면서 연결 기준 43조원대의 누적 적자와 202조9천9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막대한 부채로 지난해에 지급한 이자만 4조4천500억원이다. 전기료 인상은 공기업인 한전의 심각한 재무난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한전의 경영 위기를 기업 등 소비자에게만 전가(轉嫁)해서는 안 된다. 한전은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을 올렸고 자구 노력을 했지만, 적자는 더 늘었다.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자구 노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국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부실 공기업인데 임직원은 고액 연봉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 위기로 한계 상황에 빠져도 최근 5년간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2천55억원 실행했다"는 질타(叱咤)가 나왔다. 적자 공기업이 고액 연봉과 성과급 나눠 먹기를 한다는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민간 기업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민 부담이다. 한전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https://www.imaeil.com/photos/2025/04/25/20250425181904121745572744_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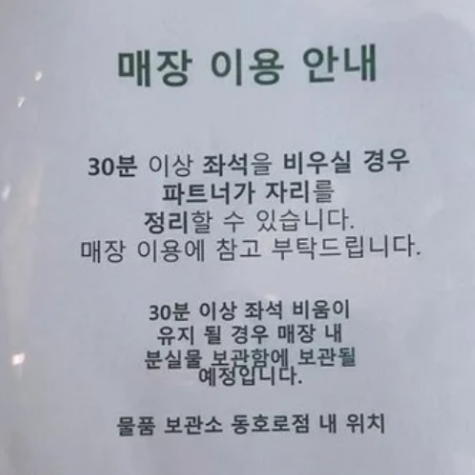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