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나무의 속내가 궁금해졌다. 울창한 숲을 호령하며 바람을 이끌던 초록의 기세가 점차 사라지면서 노랑, 주황, 빨강으로 나뭇잎 색이 변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나무는 자신이 지닌 모든 색채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마치 비우고 내려놓으며 정면을 마주하는 모습으로 뵌다.
색을 바꾸면서 자신의 전부를 열어 보이는 심정은 어떨까. 잎의 변색은 차가운 계절에 표면을 말리면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시간과 함께 축적된 경험을 나이테에 새기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오히려 화려했던 잎을 떨어뜨려 본연의 자태를 보이며 기개를 세우고 있다. 심지어 빛바랜 갈색 잎이 허공에 흩날리는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한 해를 지나는 겨울 풍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나는 길목과 닮았다.
앙상한 육체를 손으로 훑었다. 본디 마른 체구지만 부피가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다. 남편의 육신은 살면서 떼어내고 걷어낸 사연이 육신에서 빠져나간 듯 뵌다. 수북했던 머리칼은 듬성듬성하고 흰 머리가 전체를 덮고 있다. 마치 눈 덮인 겨울 나뭇가지처럼 뼈대를 지탱하며 가장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살면서 얻은 성취나 좌절의 사연은 주름진 얼굴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나잇살이 붙은 몸에 주름진 손마디는 거칠고 움직일 때마다 삐걱대는 육신은 낙엽수가 돼 세상 시름을 털어내고 있다.
삶은 힘든 시기를 지나 돌아서면 또다시 겨울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봄은 지난 추억 속에서 불쑥 솟아올랐다 사라질 뿐. 매번 현실은 겨울나무가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모양새다. 부모가 되었지만 몰라서 서툴러서 처음이라서 허둥댔던 경험이 훨씬 많았다. 좋은 날이면 콧노래가 나오지만 비바람이 불 때면 막막한 심정에 속이 갑갑해지는 터다. 아이들이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기주장을 앞세우면 늙은 나무와 젊은 나무는 서로 등을 지고 침묵한다. 이미 지나온 세대가 아직 겪지도 않은 걱정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정작 오래된 나무는 훨씬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앞을 헤치고 달려왔거늘 뭣을 염려한단 말인가. 무일푼으로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건 결국 삶은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닌가. 오랜 세월 속에 각자의 모습은 변했지만 가족이라는 숲은 찬바람 속에도 봄을 그리며 서로를 보듬는다. 메마른 잎으로 듬성듬성 감싼 나뭇가지는 보기에 약하고 텅 비어 보이지만 한 생애의 깊은 흔적과 고요한 힘이 다음 생애를 이끌고 있다.
겨울나무는 멈춰있지 않다. 온몸의 잎을 털어내고 뿌리를 내린 채 당당하게 이 계절을 걷고 있다. 잎을 내어주고 새순을 준비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을 보노라면 자연스레 삶의 윤회를 떠올린다. 나 역시 어느덧 겨울나무처럼 점점 변색되고 비워져 간다. 차가운 계절을 지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문득 궁금해졌던 속내가 되레 나에게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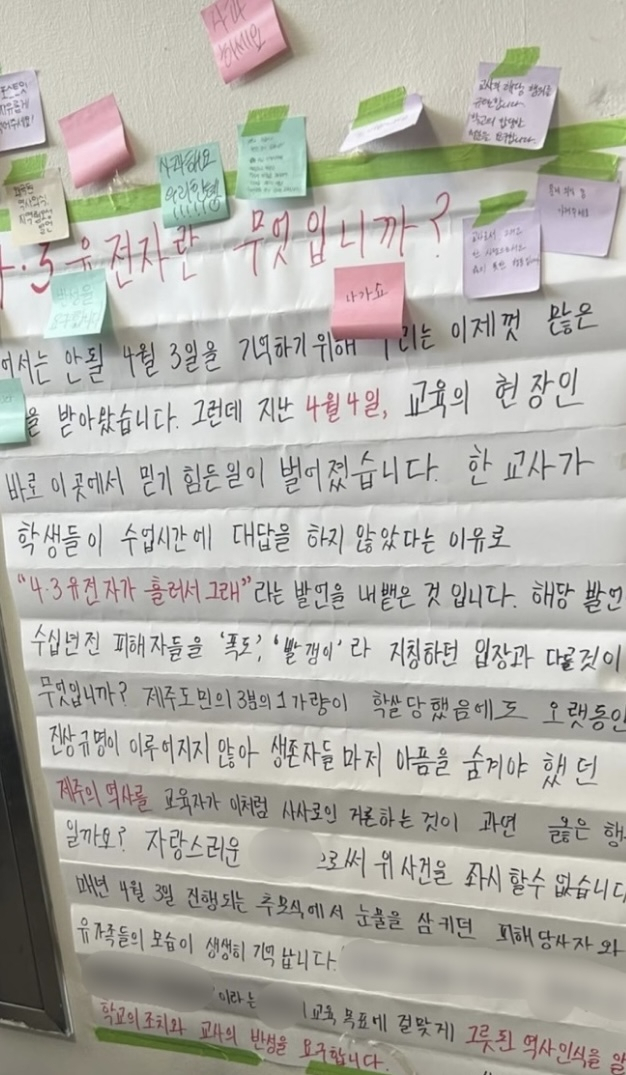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임기 못 마치고 떠나 시민께 송구…대선 승리해 금의환향하겠다"
박은정, 315일 전 尹에게 받은 난 키워 '파면 축하 난'으로 선물
홍준표, 시장직 사임 "尹 억울함 풀 것, 임기 못마쳐 죄송"
한동훈, 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尹 만난 이철우 "주변 배신에 상처받아…충성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