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필에 담으려고 지난 이야기를 깨운다. 요리조리 흔들어 보고 무엇을 넣을지 생각의 끈을 풀었다 놨다 조율하느라 생각이 많아진다. 누구나 비슷한 일상이라면 뭔가 글맛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새콤한 신맛도 났다가 구수한 맛이 감동으로 어우러져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 글. 그런 글을 갈망하게 된다.
문장을 끌기 위한 시간이 길어진다. 단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짠맛과 묘하게 어울리는 매력적인 문구를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이 겹치면 다양한 요소를 접목하려 시도한다.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감명 깊었던 책이나 영화 감상 등을 토대로 글의 흐름에 대한 반전을 꾀하기도 한다. 분명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표현이 겹치거나 과한 인용이 우려된다. 주의해야 한다. 뭐든 관심사가 비슷하다면 시선을 끌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면 받기도 한다.
글을 배우고 쓰면서 무심코 접했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다른 예술 분야에도 궁금증이 생긴다. 음악 위에 몸을 움직여 의식 세계를 표출하는 춤이라든가 감동적인 순간의 풍경을 색채로 표현한 그림 등이 그렇다. 같은 곡이라도 춤사위가 다르고 같은 경치를 그린 그림인데 전해오는 느낌이 남다르다. 끝없는 창작의 고통 속에서 탄생한 작품을 마주한 마음은 바로 깨달음이다.
무언가 새롭게 만드는 작업은 그 사람의 전부를 쏟아내는 일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우연히 접한 수필과의 만남은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 받기 충분했다. 그저 마음의 세계를 문자로 다독이며 걸어가는 거다. 만일 누군가 수필을 쓰고 싶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담긴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이듯 쓰길 권하고 싶다. 삶의 경험에서 터득한 깨달음을 곱게 펼쳐 그 속에 담긴 나를 바라보며 펜을 들어보자.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곱게 첫 문장을 얹는다. 다음으로 일상의 기쁨, 아쉬움, 슬픔 등을 살며시 풀어본다. 어쩌면 한 편의 수필을 읽는다는 건, 글쓴이의 비단 보자기를 건네받아 풀면서 스스로 속을 다독이는 게 아닐까. 조금씩 천천히 내면과 동화될 수 있도록 단어를 잇고 문장을 세워 읽는 이에게 다가간다. 내 안의 수만 개 길은 매번 다른 모양의 보자기를 품고 있으니, 누구든지 다양한 수필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
속 깊이 간직한 비단 보자기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아보자. 글의 완성은 그것을 펼치는 독자의 마음으로 이뤄진다. 설령 읽다가 덮어버릴지언정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요즈음 세상에 남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 글도 마찬가지다. 그냥 외면해도 어쩔 수 없다.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도 시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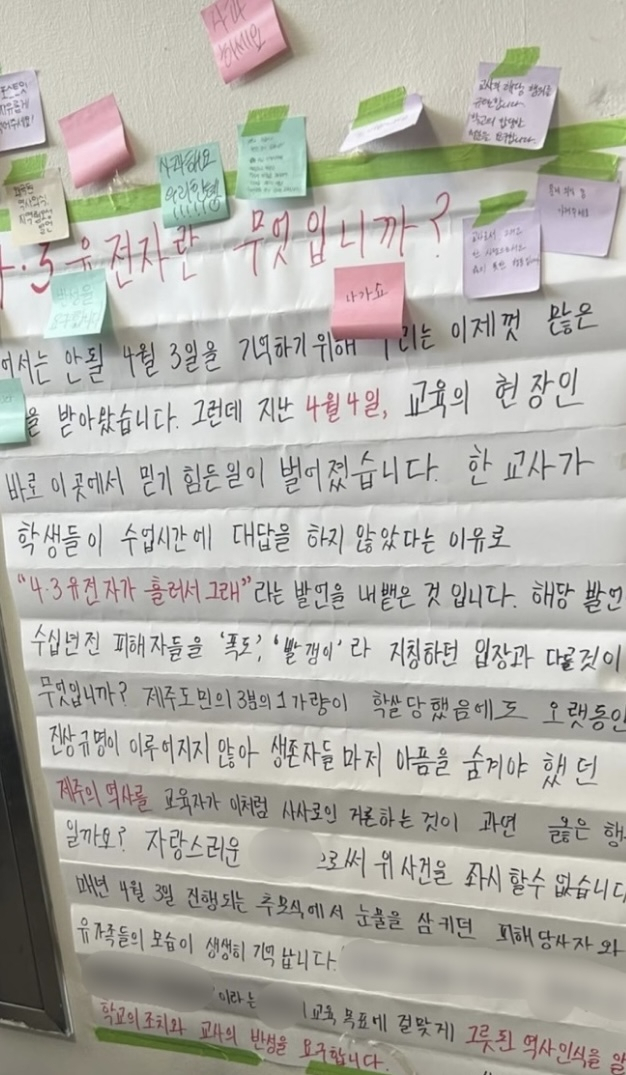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임기 못 마치고 떠나 시민께 송구…대선 승리해 금의환향하겠다"
박은정, 315일 전 尹에게 받은 난 키워 '파면 축하 난'으로 선물
홍준표, 시장직 사임 "尹 억울함 풀 것, 임기 못마쳐 죄송"
한동훈, 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尹 만난 이철우 "주변 배신에 상처받아…충성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