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자주 듣는 언어를 보면 금방 안다. '탄핵, 국정 마비, 입법 독재, 비상계엄, 내란 수괴, 부정선거…' 등등 온갖 어둡고 무거운 정치 언어들이 세상을 짓누른다. 그런 만큼 나라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이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권력에 눈먼, 어설픈 삼류 정치꾼들이다. 그들에겐 권력의 독식 외에 뵈는 게 없다. 나라도 민생도 모두 뒷전이다.
세상은 두 눈에 비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의 배후엔 보이지 않는, 부단히 움직이는 진실이 있다. 이 한 수를 읽어낼 또 하나의 숨은 눈을 갈고닦아야 한다. '안목'이다. 생각과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생기는 마음의 눈이다.
만해 한용운의 이야기다.
'나는 어느 날 낙원동의 어느 여관으로 시골 친구를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그 골목에서, "상추 사려, 양상추요" 하고 외치면서 지나가는 상추 장수가 있었다. "상추 장수!"하고 부르면서 어느 여관집으로부터 빨리 나오는 중년 여자가 있었다. "예" 하면서 상추 짐을 받쳐 놓은 상추 장수는 상추 덮었던 부대 조각을 걷어 놓는다. 그 여자는 상추를 뒤적거려 보더니 "상추가 잘군" 하더니 뜨막하고 섰다. 상추 장수는 껄껄 웃으면서 "예, 잘게 보면 잘고 크게 보면 크고 그렇지요" 한다. 나는 그 광경을 보다가 상추 장수의 나중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한 수를 더 살펴보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깨침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대체로 깨침의 눈은 욕망에 갇혀 있다. 숟가락을 자기 입 쪽으로 끌어당기며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라. 물건을 껴안는 모습을 눈여겨보라. 모두 자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향한 욕망에 이끌려 산다. 그래서 자기편에 서서, 세상의 편에 서지 못한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욕망이 죄를 만들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욕망이 바로 자신의 관이고 무덤이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다 허접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살모사와 두꺼비에 대한 것이다. "잔뜩 알을 밴 두꺼비는 살모사에 일부러 잡아먹힌다. 하지만 두꺼비는 살모사의 몸속에서 알을 낳고 그의 새끼들은 살모사의 몸을 다 먹어 치우며 자라난다. 마침내 두꺼비를 죽인 살모사는 죽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두고 어느 불교학자는 '여래의 몸은 몸 아닌 것을 몸으로 삼고, 여래의 마음은 마음 아닌 것을 마음으로 삼는다'(如來之身, 非身是身, 無識是識)는 비유를 끌고 오기도 한다. 어쨌든 크고 많은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꺼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선 위대한 일들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상은 누가 두꺼비이고 누가 살모사인지 구별하기 힘든 생명의 연쇄로 되어 있다. 권력도 생태계도 그렇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엎치락뒤치락, 생사의 지속만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살필 것인가에 있다. 안목의 차이 말이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대는 살쾡이를 보지 못했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튀어나올 작은 먹잇감을 노리며 동쪽 서쪽으로 뛰어다니고,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지." 제법 쓸모 있고, 잔꾀가 발달한 것처럼 보이나, 아차 하는 순간 골로 가고 마는 권력자들을 생각하게 한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해치우려 하지만 결국 그 자신이 어리석게도 세상의 덫에 걸려 죽음에 내몰리는 역설을 마주한다.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일들은 대개 시끄럽고 비정상적인 사건들이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조용한 법이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기침 소리가 없고, 고장 나지 않은 차가 덜덜거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미 그렇고 그런데도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것"(已而不知其然)을 도(道)라 하듯, 정상적인 것은 왜 그런지 몰라도 그저 잘 굴러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말이다. 한번 돌이켜보라. 위장이나 무릎, 눈알이 '나 여기 있소!'라며 수시로 자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그곳은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몸이 그렇듯, 세상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잘 굴러간다면 세상사 뭐가 뭔지 잘 몰라도 된다.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돌아간다.
날이 갈수록 그저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 그 이유도 대략 알겠다. "아무 일 없지?"라는 흔한 인사말 속에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으면 됐다!'는 오래된 상식이 숨어 있다. 세상 일이란 이 일이 터지면 저 일도 함께 불거진다. 평범한 말이지만 『채근담』의 다음 구절을 곱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한 가지가 일어나면 한 가지의 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천하는 항상 '무사함'을 복으로 여긴다."
그렇다. 기쁨에 슬픔에 기대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나쁘다. 그러니 차라리 '아무 일 없음' 쪽으로 안목을 열어놔야 한다. 그럴수록 '아무 일 없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순간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알게 되리라. 이 소박한, 평범한 안목에 기대 새해를 맞이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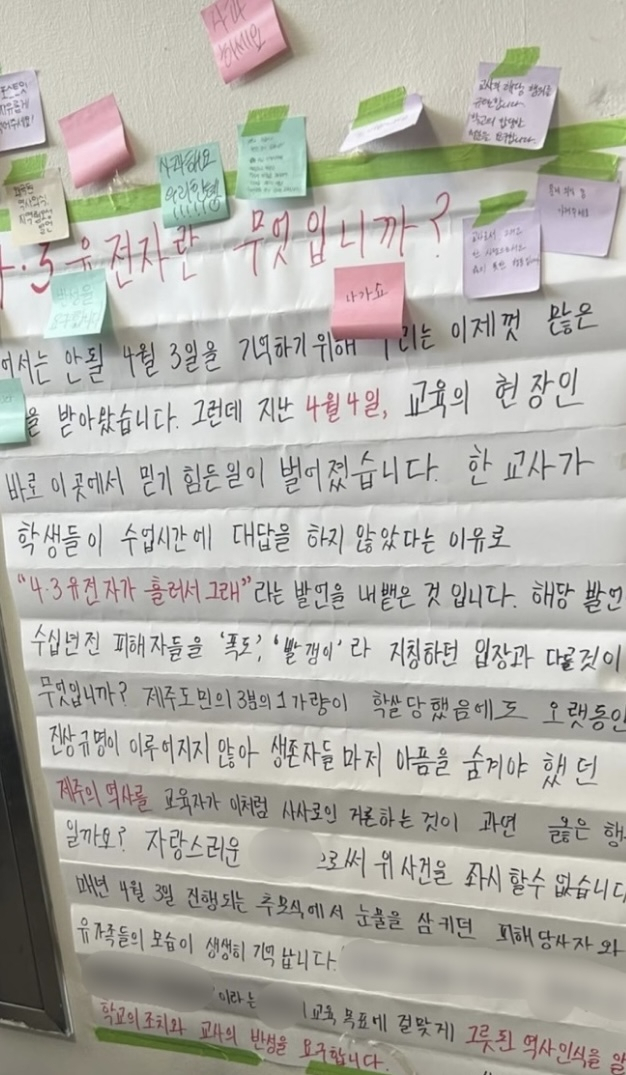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임기 못 마치고 떠나 시민께 송구…대선 승리해 금의환향하겠다"
박은정, 315일 전 尹에게 받은 난 키워 '파면 축하 난'으로 선물
홍준표, 시장직 사임 "尹 억울함 풀 것, 임기 못마쳐 죄송"
한동훈, 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尹 만난 이철우 "주변 배신에 상처받아…충성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