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여자 주인공들](https://www.imaeil.com/photos/2025/01/15/2025011514540706979_l.jpg)
한때 한국영화의 여성은 남성의 호명 없이 스스로 스크린에 등장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남성 주체가 과거로부터 소환한 애도의 대상이거나 남성을 애도하는 객체로 존재했다는 얘기. '별들의 고향'의 경아는 누가 죽었느냐는 뱃사공 물음에 "여자가 죽었습니다."라는 화가 문호의 호명으로 등장하고, '영자의 전성시대'의 식모 영자는 주인집 아줌마의 부름으로, '박하사탕'에서 김영호의 첫사랑 순임은 "윤순임이 아시죠?"라는 남편의 질문으로 등장한다. '파이란'의 파이란은 강재의 애도 대상으로 존재하며 '꽃잎'의 소녀는 죽은 엄마를 애도하고, 군홧발에 유린된 광주를 애도한다. '스카우트'의 세영 역시 80년 광주를 떠올리며 자신을 구해준 친구 이호창을 애도하는 역할이다. 이를테면 영화에서 남성의 호명 없이 여성캐릭터가 단독으로 등장한 건 불과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현대소설 연구자 오자은 교수가 펴낸 '여자 주인공들'은 한 마디로 지난 50년간 한국소설은 여성을 어떻게 상상해 왔는지를 묻는 탐구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부조리한 관습과 구조적 모순 속에서 영원한 타자로 변경을 맴돌다 좌절한 여성들의 삶과 아픔에 대한 헌사로 읽힌다. 또한 이 책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학문적 이력을 점검함으로써 쉼표를 찍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저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책은 총 9편의 소설 속 여자주인공을 다루며 전후 현대사를 관류한다. 박완서에서 은희경을 경유해 최은영까지, '나목'의 이경에서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의 진희와 '밝은 방'의 지원까지. 즉 서울로 상경하여 가족의 생계와 동생 학비와 아버지의 약값을 책임졌던 60년대 여공들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중산층 집안의 딸과, 급변하는 세상에서 몸의 주체성과 가벼움을 추구한 90년대 지식인이, 시대별로 차곡차곡 자기자리에 놓인다. 저자가 분석한 여자 주인공들은 집단주의 속에서 독립성을 추구하거나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이 되는 경제개발 시대를 거친 후 개인화 파편화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60~90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지침서로 보인다.
사적으로 은희경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경쾌한 여자들을 내세워 삶의 순정을 믿는 세계를 냉소적으로 그린다는 데 있다. 은희경의 인물들은 '운명의 비극적 그림자를 끌고 다니지도 않고, 80년대 변혁운동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으며 가족과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즉 '여자 주인공들'에서 오자은이 말한 "가볍게 살고 싶은 진희. 인생을 사소하고 잘게 나누어서 여러 군데에 걸쳐놓겠다는 진희"와 상통한다. 결국 "이는 어쩌면 '전부를 바쳐서 커다란 것을 얻으려고' 한 자들의 끝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나, "전부를 바쳐서 얻으려 한 '커다란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쉽게 허약해질 수 것인지를 지켜본 사람만이"(246쪽) 낼 수 있는 목소리일 터.

종종 문학평론을 찾아 읽는 건 영화 평론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도저한 사유가 종갓집 예법처럼 복잡하지만 듬직하고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말장난과 쿨함으로 삶의 비루함을 포장하는 에세이 전성시대에 이토록 지적 쾌감을 안겨주는 책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여자 주인공들'은 근래 읽은 어떤 평론집보다 재미있고 흥미롭다. 저자가 공지영보다 은희경에게 더 친밀해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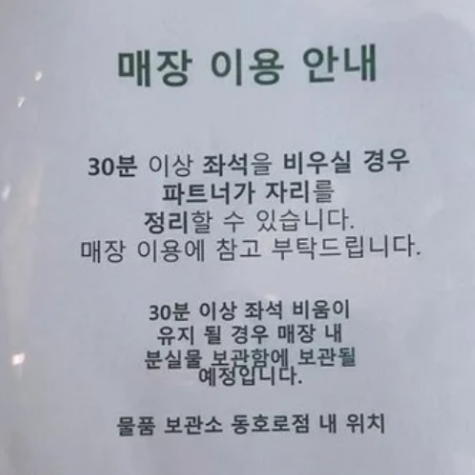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