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천달러를 넘어섰다는 추계가 나왔다. 올해도 정부 전망치만큼 경제 규모가 커진다면 3만7천달러대 진입도 가능하다. 한 국가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총액을 합친 GDP는 국가 경제 규모 측정과 비교에 쓰인다. 물가 변동을 감안한 실질(實質) GDP와 이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名目) GDP로 나뉘는데, 1인당 GDP는 명목 GDP(2천542조여원)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약 1천364원)을 적용해 달러로 바꾼 뒤 전체 인구(5천175만여 명)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1인당 GDP 상승 이유는 수출 증가와 물가 인상 때문이다. 생산량이 같아도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가 커진다. 환율 상승은 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1인당 GDP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다는데, 이를 두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도 높다고 해석해선 곤란하다. GDP에는 기업·정부가 번 돈도 합쳐져서다. 1인당 소득은 국민총소득(GNI)으로 비교하는데 이것 역시 벌어들인 돈만 합산한 것이어서 처분가능소득, 즉 국민들이 체감(體感)하는 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2022년부터 물가 상승이 근로자 평균 소득 증가를 앞질렀다. 월급은 찔끔 올랐는데 물가는 연이어 껑충 뛰었다는 말이다. 2022년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세법을 바꾸자 이듬해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이 6만원 줄었다. 그런데 평균일 뿐이다. 소득 9억6천만원인 최상위 0.1%의 세금은 1천800만원 이상 줄었고, 소득 3천300만원인 중위 50%의 세금은 오히려 늘었다. 물론 세 부담 자체는 최상위권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자 기준 평균 임금은 4천332만원인데, 같은 해 1인당 GDP보다 850만원 정도 적었다. 월급 명세서 소득과 국가 경제 비교에 쓰이는 통계상 소득과의 괴리(乖離)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빈곤층 소득은 거의 불변인데 초고소득층은 경제성장이나 물가 상승폭보다 훨씬 소득이 늘어난다. 국가 경제의 덩치가 커져도 중산층 이하의 평균 소득은 도리어 감소할 수 있다. 1인당 GDP 증가가 애국심을 고취(鼓吹)시킬지 몰라도 가벼워진 지갑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을 계속 잠재울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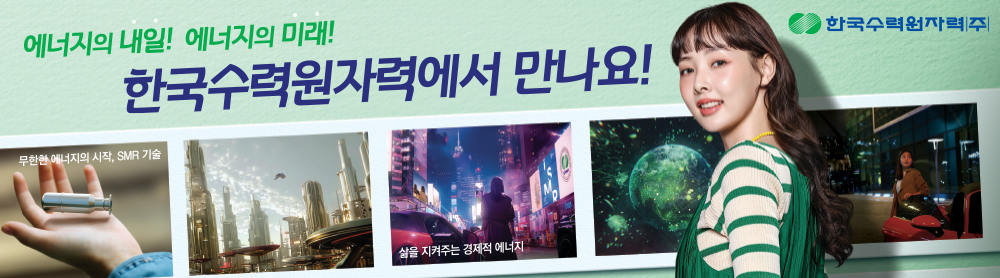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현충원서 또 "예의가 없어" 발언…왜?
민주당 권리당원의 외침 "전국이 불타는데 춤 출 때냐"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국무위원 전원 탄핵?…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일타뉴스]
홍준표, '개헌' 시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탄핵정국 끝나면 국가 대개조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