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인의 시선은 세상과 시대를 항상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지극히 개인의 몫이겠지만, 한 줄의 글로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문인의 눈빛은 예리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 섬세함을 비판이라는 말로 단정지어보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자유지만, 무릇 문인이라면 자신이 속한 곳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언제든 비판의 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칼날이 무르든 벼리든 찌르는 방식 또한 본인의 선택이다.
필자는 재작년 가을에 시골에서 10cm 높이의 앙증맞은 제피나무를 캐와 화분에 심고 베란다에 뒀다. 까슬까슬한 타원형의 테두리 중간을 가르는 연둣빛 무늬가 새초롬하게 박혀 있는 이파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코에 갖다 대면, 싱그러운 듯 톡 쏘는 강렬한 향이 콧속으로 들어오곤 했다. 이 새 식구에게 '판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세르반테스의 고전 소설 '돈키호테'에서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하인, 산초 판사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사실 사람들은 제피나무와 산초나무를 곧잘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차피 사촌쯤 된다고 여겨서 성으로 산초를 갖다 붙이고 '판사'라는 어마어마한 법조인 직책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베란다를 열 때마다 "판사, 안녕?", "판사, 굿나잇!" 하며 즐거운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 이듬해 봄부터 판사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더니 초여름쯤 되자 1미터를 웃돌았다. 문제는 기둥이 굵어지지 않고 위로만 자란다는 것이었다. 머잖아 베란다 천장을 뚫고 재크의 콩나무처럼 하늘까지 닿을 판이었다. 결국 차에 싣고서 다시 고향으로 이사시켰다. 아버지는 멀대 녀석을 보자마자 피식 웃더니 할아버지 무덤 근처에 옮겨 심어줬다. 미안하기도 했고, 정이 들어서 차마 판사의 마지막 모습은 보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왔다.
돈키호테의 이웃인 산초 판사는 가난하고 좀 모자란 농부였다. 그래도 정신 줄을 놓고 다니는 주인을 따라다니며 고생하는 인물인데, 어설프긴 해도 적당한 상식과 인간애를 가진 현실론자이며 심지어 맞지 않는 자리에서 떠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현명함까지 갖추었다. 낭만과 이상을 좇는 돈키호테와 달리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세상 속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지금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양극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잘 안다. 그렇지만 지금쯤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진 심정을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매한 듯 현명한 산초 판사의, 미련한 듯 지혜로운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번씩 격언을 인용해 허를 찌르는 판사의 아래 명대사처럼 문인이든 한 개인이든 작금의 현실에 들뜨지 않고 일상을 담담하게 지켜내면 좋겠다.
"치사한 소유보다 훌륭한 희망이 더 낫다!"
이래저래 판사가 그리운 날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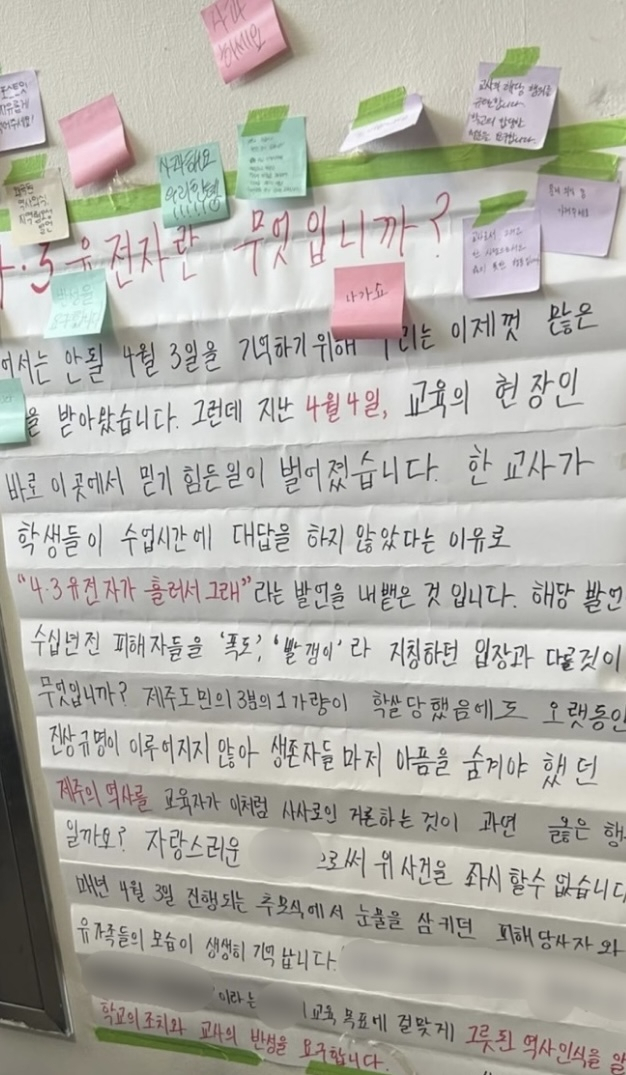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임기 못 마치고 떠나 시민께 송구…대선 승리해 금의환향하겠다"
박은정, 315일 전 尹에게 받은 난 키워 '파면 축하 난'으로 선물
홍준표, 시장직 사임 "尹 억울함 풀 것, 임기 못마쳐 죄송"
한동훈, 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尹 만난 이철우 "주변 배신에 상처받아…충성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