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가에서 태어난 자하 신위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11살 때 정조가 '재동(才童)'으로 소문난 신위를 궁중으로 불러 시와 글씨를 직접 시험해보고 칭찬한 일이 있다. 묵죽은 강세황에게 배웠다. "어린 시절 강표암을 본떠 배워 수제자라는 그릇된 추앙도 받아 보았네"라며 스스로 강세황의 수제자를 자부했는데 다만 죽석 한 가지만 배웠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젊을 때는 양반사대부로서 대나무와 바위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된다고 여겼던 것이 나이 들어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신위는 강세황 묵죽의 성글고 묽은 맛을 계승해 대나무의 강인함 보다는 격조와 우아함이 특징이다. 강세황이 그렇듯이 신위도 화보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위는 당시 청나라의 새로운 경향을 흡수해 '묵죽'과 같은 장축(長軸)의 죽석화 대작도 그렸다. '묵죽'은 농묵과 담묵으로 죽엽을 평면적이지 않게 표현했는데 먹색을 물맛으로 잘 살려낸 담묵이 더욱 인상적이다. 바위도 담묵을 위주로 했다. 필획이 온화하고 먹색의 농담 변화가 급격하지 않아 그의 글씨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화면의 왼쪽 변을 중심으로 바위를 높게 그려놓고 위와 아래에 두 무더기로 대나무를 그렸다. 두 폭이 한 세트를 이루는 대련에서 즐겨 쓰이는 구도로 나중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난초그림에서 이런 석란이 많이 보인다.
신위의 묵죽은 중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권세가를 비롯해 소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위가 승정원에 근무할 때 동료들에게 묵죽을 그려준 일이 있었다. 한 하급 서리가 감히 부탁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내가 어찌 너에게만 인색하게 굴 것이냐"라며 그에게도 그려주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신위의 넓은 도량을 보여주는 일화는 또 있다. 어느 해 설날 세배 온 화가 이유신이 책상 위의 괴석을 어루만지며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아끼던 이 돌을 선물했다고 '이향견문록'에 나온다. 호가 석당(石塘)인 이유신은 돌을 사랑하는 벽이 있었다. 그림 인심이 좋았던 신위가 주위에 그려주었던 부채그림 묵죽도 여러 점 전한다.
서명은 '자하산초(紫霞山樵)'이고 인장은 '자하(紫霞)', '소재묵연(蘇齋墨緣)'이다. 소재는 신위가 북경에서 직접 만났던 청나라 옹방강의 서재 이름으로 동파 소식을 존경한다는 뜻이다. 신위도 소재를 당호로 사용했다. 산초는 산에서 나무하는 나무꾼인 초부(樵夫)다.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거나, 땔 나무를 하거나, 밭을 갈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어부, 초부, 경부(耕夫), 전부(田夫) 등으로 자처했다. 양반사대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출세와 명예를 낚으려는 사람들로 혼잡한 관료사회를 떠나 자연에 묻혀 촌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심정이다. 오른쪽 아래의 글은 '후학(後學) 석운(石雲) 박기양(朴箕陽) 감정(鑒正)'이다.
미술사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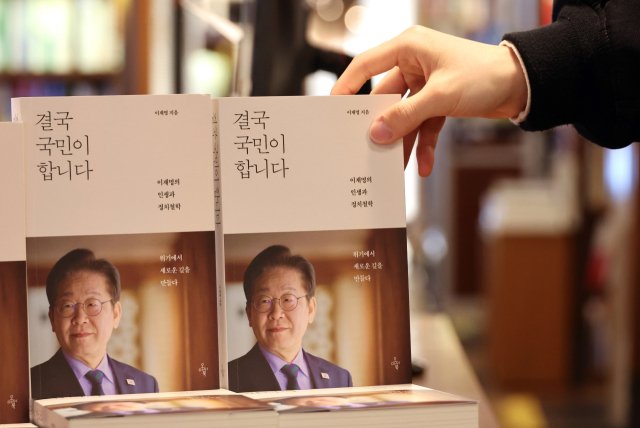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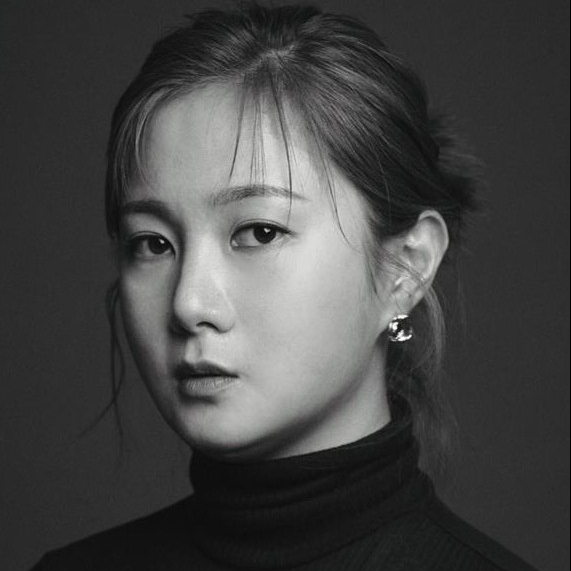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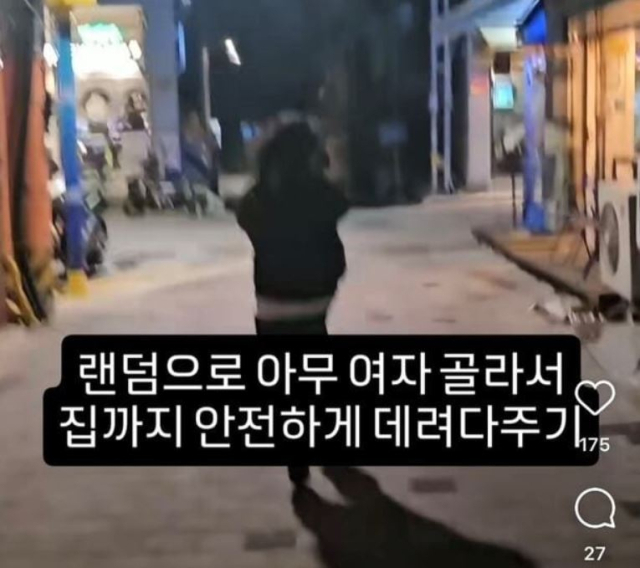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