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고임생 할머니는 4.3으로 남편, 아들, 손녀를 잃고 6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4.3을 겪으신 제주 어머니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 작가입니다. 4.3을 온몸으로 겪은 제주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름 한 자 명확히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마을의 4.3 위령비에도 누구의 딸이거나 자녀, 처로 기록되어 있지요. 나고 자라고 삶을 일구는 인생 전체에 과연 여성의 이름은 기록될 수 없는 걸까요? "4·3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전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고임생 할머니는 4.3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삶을 살았습니다. 며느리와는 연락이 단절 된 상태이구요.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앗아간 제주 4.3이 남긴 깊은 상처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극 <오사카에서 온 편지> 극중인물 작가의 대사 중)"
<오사카에서 온 편지>(작, 강은미·정민자 연출 정민자, 세이레아트센터)는 극중인물 고정자, 시어머니 노모를 통한 제주 4·3 사건 피해 여성 서사라는 점과 극중인물 작가(강상훈 분)를 통한 제주 4·3 사건 가해 가족(서북청년단)으로 자기반성적 고백을 취재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영상은 모큐드라마적이고 무대공간의 극 중 장면의 배치는 연극적이다. 제주 4·3 사건 당시 아들과 남편, 손녀를 잃고 며느리(고정자)마저 사건의 후유증으로 오사카로 떠나 살아온 극중인물 며느리 고정자(김이영 분)와 시어머니인 노모(김금희 분)를 중심으로 60년 세월을 역주행하며 역사의 비극적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극중인물로 분한 작가(강상훈 분)는 제주 4·3사건으로 아들과 남편, 손녀까지 희생된 그날을 잊지 못하며 치매인데도 그날만을 기억하며 아들을 기다린다. 4·3으로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여성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작가는 제주 4·3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모의 가족사를 따라가면서 무대를 통해 과거와 현재에도 치유될 수 없는 4·3의 아픔을 애도하게 된다.

◇죽음의 섬 4·3의 제주, 기억과 애도의 방식
<오사카에서 온 편지>는 노모의 기억이 파편적으로 재현되는 4·3사건의 가족사는 '제주 동북리'가 배경이다. 노모의 비극적 가족사와 현재 오사카에서 살아가는 며느리를 중심으로 극 중 장면들이 전개되면서 그날의 시간이 재현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서북청년단에 의해 아들과 남편이 희생되고 간난 손녀마저 죽은 뒤, 며느리마저 오사카로 밀항(密航)한 뒤 60년을 생이별해야 했던 침묵의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소극장 무대인데도 역사적 사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대공간을 세분화했다. 무대 뒤편으로는 영상이 투사될 수 있는 스크린이 배경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며느리 고정자가 제주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는 다큐 영상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좌측 공간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 동북리 마을에서 살아가는 고임생의 젊은 날 집 구조의 공간이다.
중앙 뒤편은 노모와 며느리의 기억으로 재현되는 과거 공간으로 아들 강길남과 젊은 고정자가 결혼하기 전 두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4·3사건 이전의 시간이 파편적인 장면들로 연속된다. 무대 우측은 오사카에 위치한 '시츠카네 식당'으로 고정자의 일본 이름이다. 무대는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구조다.
작가가 80대가 되어버린 며느리 고정자가 살아가는 '시츠카네 식당'을 취재차 방문하면서부터 2008년도의 시간부터 4·3 사건으로 변주되어 죽음으로 사라진 가족을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식당에 고정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제주 4·3 평화상 첫 수상자인 재일 제주인 소설가 김석범 작가의 '과거로부터의 행진'에 등장하는 작가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제주 출신 주인공 고재수가 '고향에 가는데 왜 허가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연'들이 전파로 흘러나오면서 당시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한국인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사카로 밀항(密航)한 뒤 60년 동안 희생된 남편과 딸을 가슴으로 묻고 살아야 했던 고정자는 일본인 마유(이릇영실 분)을 12살 때 수양딸로 삼은 뒤에도 어린 딸을 잊을 수 없는 제주 4·3은 삶의 통증으로 다가왔고 남편의 죽음은 애써 잊고 살아야 하는 기억의 파편들로 혈전 되어 있다. 무대는 작가가 고정자에게 건넨 가족사진 한 장으로 '시츠카네 식당'부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 동북리에서 벌어진 그날의 참혹한 시간이 서북청년단 대장(이경식 분)과 청년단들은 총을 들고 마을을 뒤지며 빨갱이 소탕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아들 강길남과 딸의 죽음, 20대의 젊은 고정자와 강길남의 사랑 고백과 친구 길남의 여인인 젊은 고정자를 사모하는 충훈(김시혁 분)과의 갈등들로 전환된다.
사진 한 장의 과거를 통해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노모 고임생의 가족사를 <오사카의 온 편지>에서 작가는 서북청년단에 의한 길남의 죽음을 충훈의 밀고를 통해 희생된 것처럼 복선(伏線)을 형성하고 있다. 충훈과 젊은 시절 고정자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중략) 길남이는 돌아오지 못한다. 산에 간 사람들 다 죽었댄 말 들엇져.(중략) 길남이는 안 돌아온다"고 말한 장면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작가적 설정과 인물관계의 복선이 오사카로 건너온 뒤 살아오면서 만난 남편이 죽은 뒤에도 혼자 살아가는 고정자의 부재한 남편이 충훈을 연상하게 하는 동일 인물일 수 있는 불확정적인 관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은 제주 4·3 여성의 길 걷기 행사를 위한 60년 만에 제주 땅을 밟은 고정자의 현재가 영상의 스크린으로 담아지고 서북청년단이었던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는 작가의 반전으로 무대는 마치 4·3사건의 희생자들인 망자들을 소환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애도와 치유의 씻김을 배우들의 퍼포먼스로 벌이고 고정자의 가슴은 여전히 제주 4·3으로 죽은 딸의 형상으로 묻혀있다.

◇역사재현과 은유
<오사카에서 온 편지>에서 아쉬운 점은 제주 그날의 진한 아픔도, 4·3 사건의 충격적 전류도, 역사의 반성적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60년 전의 그날을 노모와 며느리의 기억으로부터 파편적인 시간으로 역주행하며 재현되는 것보다 현재의 노모(제주도)와 며느리(오사카)의 삶들에서 씻겨낼 수 없는 60년의 시간으로 그려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다. 전쟁 같은 역사적 시간을 무대로 소환한다고 해서 그 아픔을 연극으로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때로는 그날의 사건보다 그날로 살아가는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도려낼 수 없는 아픔의 내면을 무대로 감각화 했다면 어땠을까. 희곡은 그런 관점에서 보완하면 좋겠다. 희생의 시간은 특정 장면들만 추려내고 표현의 방식은 은유적으로 했다면 한다.
소극장 무대에서 제주 4·3의 시간을 현재-과거-현재로 배열해 역주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빨갱이 소탕 작전을 벌이며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서북청년단들의 잔혹성도 충격적이거나 입체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사카에서 온 편지>는 제주도 세이레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될 만한 소재이고 관객들도 이 작품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공감보다는 무대에서 재현되는 사건을 통해 제주 4·3 사건이 현재시간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각인되고 공감하는 연극적 표현의 확장성이 필요해 보인다.
시간을 되돌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 4·3 역사, 특정 극중인물, 삶과 아픔에서 시공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연극적 장치와 작가적 설정들이 필요해 보인다. 때로는,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역사를 무대 재현으로 마주하는 것보다 희생된 역사의 시간을 애도할 수 있게 기억하게 하는 방식의 구조와 무대 형상화에 대한 것이 아쉽다. 그런 점에서 제주 4·3 사건으로 남편과 딸을 잃은 뒤 80대가 되어버린 고정자의 삶을 더 중심적인 설정으로 플롯화 했다면. 마유로 분한 이룻영실은 억양, 톤, 표정과 이미지 연기가 완벽한 재일동포 2세이다. 부산 출신 재일동포 마츠코( 이지선 분)는 웃으면서도 아파올 수 있도록 타이밍 연기의 조미료가 좋았고 작가 강상훈, 노모 고임생의 연기(김금희)가 희곡을 보완하는 역할을 보였다.
김건표 대경대학교 교수(연극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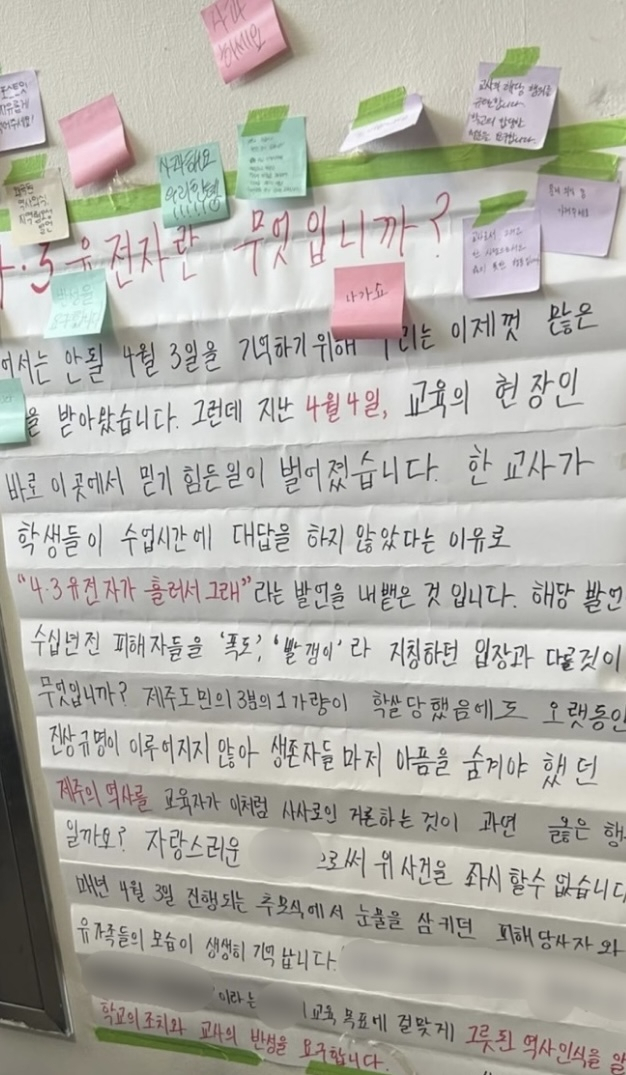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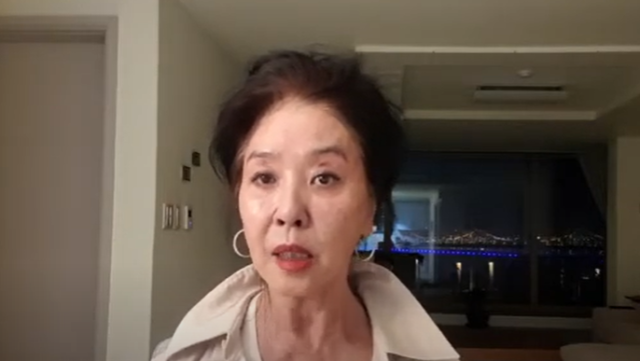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임기 못 마치고 떠나 시민께 송구…대선 승리해 금의환향하겠다"
박은정, 315일 전 尹에게 받은 난 키워 '파면 축하 난'으로 선물
홍준표, 시장직 사임 "尹 억울함 풀 것, 임기 못마쳐 죄송"
한동훈, 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尹 만난 이철우 "주변 배신에 상처받아…충성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