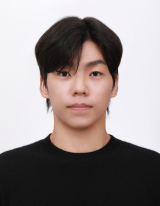
"시험지도 받기 전에 OMR 카드에 한 번호로 줄 세우고 자는 학생이 넘쳐납니다!"
취재 초기에 만난 대구 한 중학교 교사는 다문화 학생들의 시험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문제를 읽으며 답을 고를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교사의 발언은 다문화 중·고등학생들을 한 달 가까이 만나면서 '증언'으로 다가왔다.
중학교 2학년을 앞두고 초등 수학의 사칙연산에서 헤매는 학생을 만나면서다. 곱셈과 나눗셈을 푸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결국 기초 부진으로 분류됐고 재시험 세 번 만에 간신히 통과했다.
영어도 겨우 알파벳을 외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학생은 기자에게 "한국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 언어를 어떻게 외우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국에서 3년 넘게 학교를 다녀도 언어 장벽에 막혀 옥편까지 구매한 학생도 있었다. 교사의 판서를 사진으로 찍어 공부하고 싶다던 그 절박함을 잊지 못한다.
학생들이 학업 부진에 허덕이지만 지원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국어와 수학 등 교과목 공부를 돕는 기초 학습 지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에 그쳤다. 학업 난이도가 한층 까다로워진 중등교육에 지원이 닿지 않는 데 의문을 가졌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모국어로 공부를 돕는다는 이중언어 튜터(강사)들도 제 역할을 못 했다. 당시 기사에 담지 못했지만 "강사가 교사의 한국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중언어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겠냐"는 학생의 분노도 있었다.
학교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대학 관문을 통과한 학생은 극히 일부였다. 한 고3 수험생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사회배려자 전형'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혼자서 파악했다.
서툰 한국어로 대학 모집 전형을 번역하는 데 온종일 시간을 쏟기도 했다. 외국인 전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운 이 학생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학교에서 알려 주는 게 올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다.
주 6일 공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원할 여력은 없었다. 한 다문화 학생의 어머니는 월 230만원 수입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생계에 급급한 처지여서 교육 정보를 귀동냥할 여유조차 없었다.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는 달리 정부는 이들을 '미래 인재'로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과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위 사례들을 비춰 봤을 때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학생들은 정부가 보장한 동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실에서는 '같이' 있지만 배움은 '따로'였다.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중·고등학생들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미 대구·경북에서는 2019년 3천21명이었던 학생 수가 지난해 8천31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등교육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 수도 지난해 기준 1만691명이나 된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학생 수만큼 교육에서 방황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중등교육의 학업 성취도가 이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학업 격차는 단순한 성적 차이를 넘어 미래의 경제적 불평등과 낙오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다.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한국인들을 대신해 이들이 진정한 '역군'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가능성이 결정되는 중등교육에서의 진짜 디딤돌이 필요하다.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습 지원이라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현충원서 또 "예의가 없어" 발언…왜?
홍준표, '개헌' 시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탄핵정국 끝나면 국가 대개조 나서야"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尹 선고 지연에 다급해진 거야…위헌적 입법으로 헌재 압박
'위헌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되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