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역' '자문역' 등으로도 불리는 고문(顧問)은 월급쟁이들의 꿈인 대기업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를 지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惠澤)이다.
임기는 1년, 2년 정도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무실과 비서·자동차(기사 포함)가 제공되는 데다 두 번 연임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월급의 70~100%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눈으로 봤을 땐 그저 황공할 따름이다!
원래 이 제도는 1970년대 전후 고도성장기(高度成長期)가 끝나면서 물러나는 임원들의 경험을 살리자는 취지로 일본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뒤인 1988년 말 삼성그룹에서 출발했다. 1990년 초반부터는 현대그룹, 선경그룹(SK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편적(普遍的)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평생직장(平生職場)이라는 개념이 강했고, 월급쟁이들의 기업 충성도 역시 엄청났다. 월급쟁이 주제에 '내가 곧 기업이다'라고 믿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문 제도의 도입은 '퇴직 후에도 대우받는 임원이 되려면 더욱더 조직에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담겼을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충성(忠誠)'에는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대기업 임원쯤 되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업 경영상의 비밀이나 그룹 오너 일가의 활동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된다. 검찰의 주요 기업 수사 때 전직 임원들의 입에서 핵심 정보가 흘러나와 오너가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고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를 다하는 것이 배신(背信)을 막는 길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른다.
'의리'를 사훈(社訓) 격인 그룹 정신으로 강조해 온 한화그룹에서 지난해 말 계열사 대표의 퇴직 통보를 하면서 '고문 예우가 없다'는 인사 방침을 밝혀 충격을 줬다. 퇴직 예우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것은 다른 그룹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업 경영이 투명해져 퇴직 임원 입단속시킬 필요성이 적어진 탓도 없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景氣沈滯)와 대내외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분석된다. "아, 옛날이여!"
sukmin@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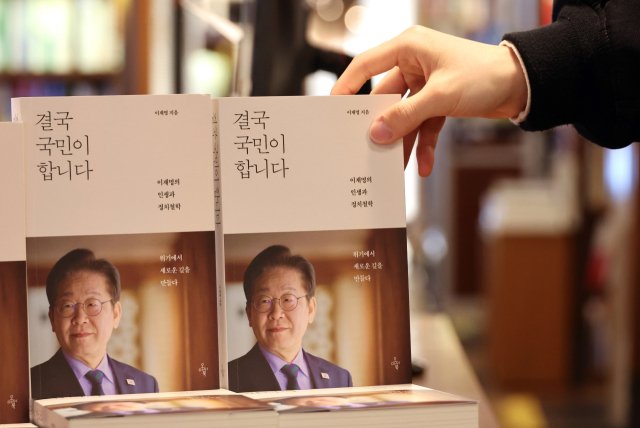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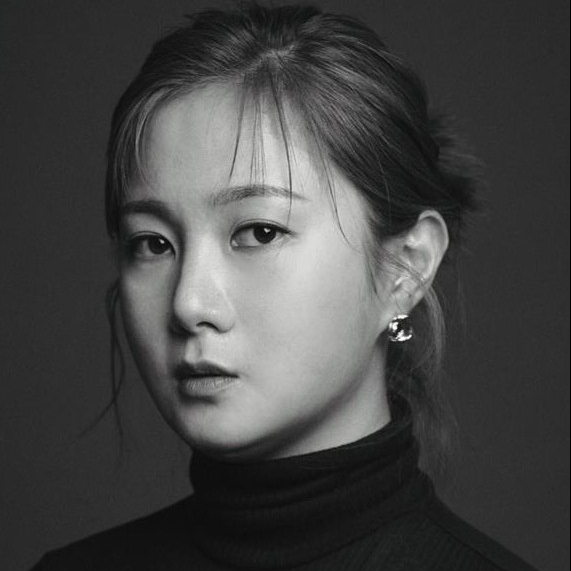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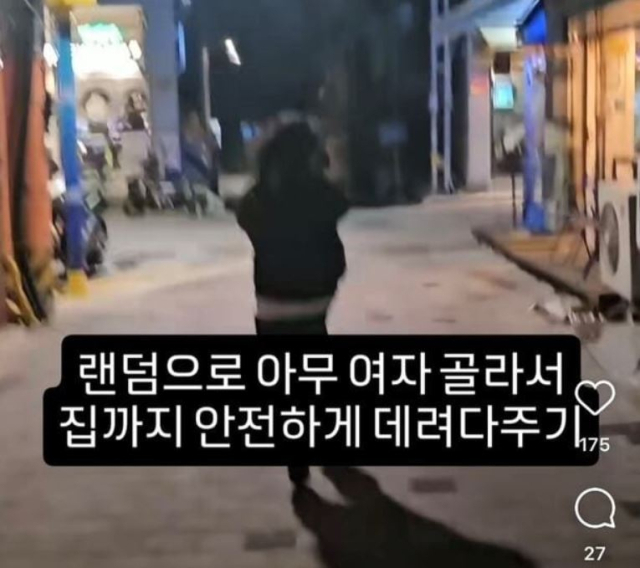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