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든 처음 일을 맡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잘해보려는 생각으로 강한 열정을 품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도덕적인 문제를 무시하며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빠져든다면, 그 일은 목표한 대로 잘 될 수가 없다.(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최근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우연히 읽었다. 알고 보니,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던 책이었다. 나는 소위 베스트셀러에 포함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아마도 그 책에 대해 길게 소개된 글을 읽고 나서 실제로 책을 읽었을 때 대부분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내용이 좋았다. 특히 위에 인용한 부분에 오래 머물렀다. 머문 이유는 전적으로 나를 되돌아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리라.
10년 가까이 독서교육 활동을 하면서, 또는 독서교육교사모임을 진행하면서, 특히 지금처럼 독서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그 일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잘해야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집착하지는 않았나 오랫동안 반추했다. 혹시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 빠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게다. 누가 뭐래도 내 삶의 주체는 '나'이다. 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미 무의미한 길이 아닐까. 그래도 조금은 스스로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내가 그 일을 잘해야 하는' 또는 '내가 열심히 하는 맛'에만 머문 것은 아니고 '그 일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에 마음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 일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택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나보다 훨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몇 가지 정책에 대해 나보다 훨씬 '그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고, 생각하고,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단지성의 힘은 대단했다. 처음 정책을 기획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됐고, 나는 그중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면 그만이었다.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더욱 '그 일'에 집중했고, 정책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바뀌면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았다. 우리들의 일이 되어버린 셈이다.
수많은 워크숍을 가졌지만 워크숍이 시작될 때는 가능하면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워크숍이 끝날 즈음에 참가해 내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워크숍을 진행하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제시되기가 어렵다. 리더가 말을 하면 지시가 되어버리고 팀원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스스로 일을 추진해나갈 에너지를 잃는다. 팀원들이 '그 일'을 추진해나갈 에너지를 잃는 순간,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한다.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가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잘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교사이든, 교육전문직이든,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준희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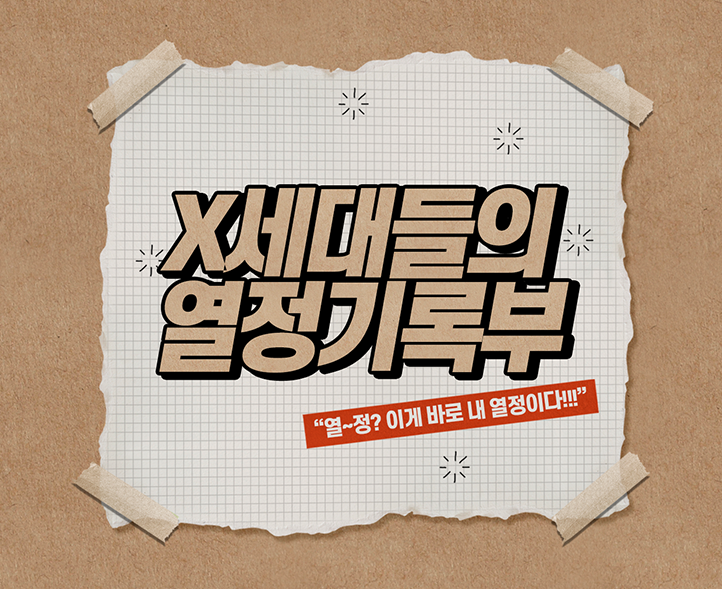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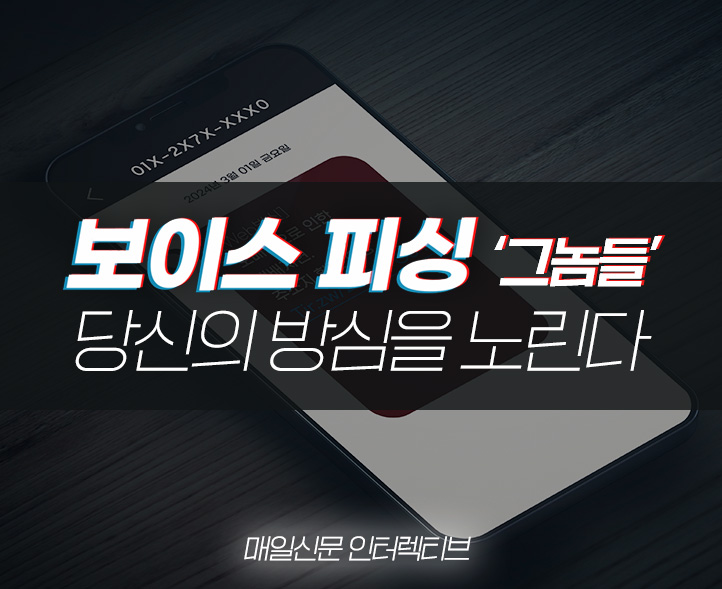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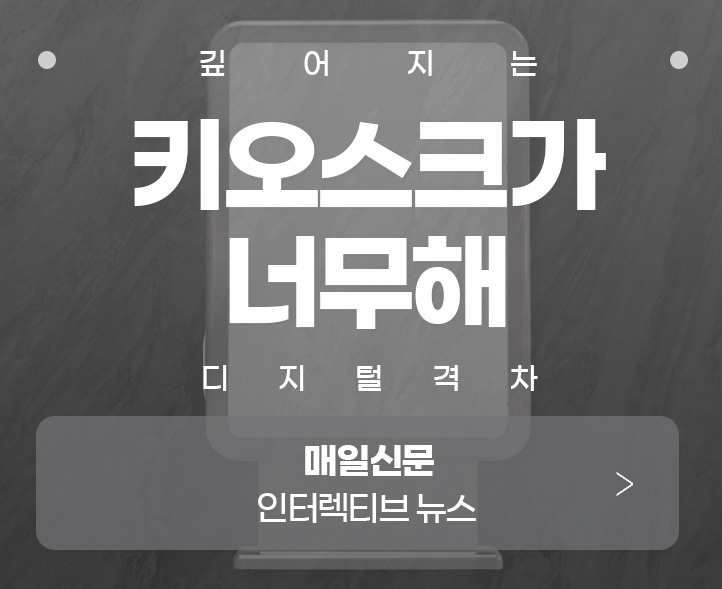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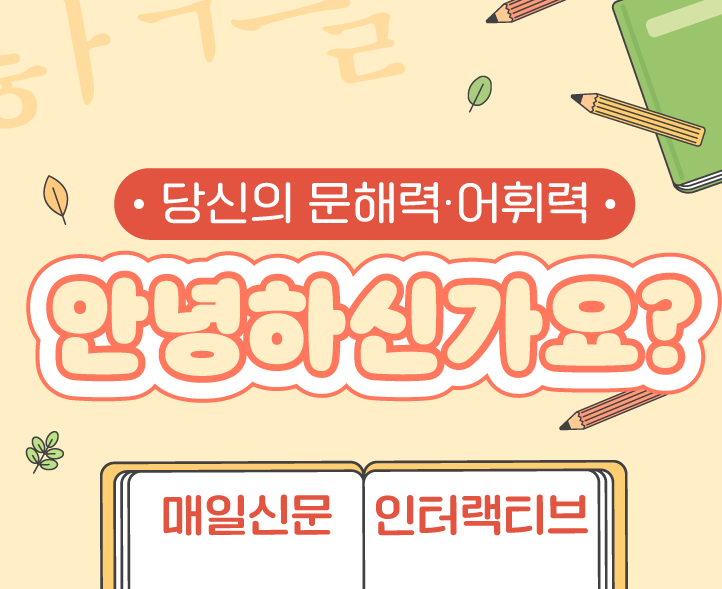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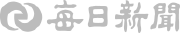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